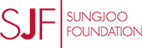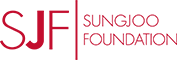SJF <Work & Life Balance>#15
Life in the Post-coronavirus Era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삶/

Jeong Yong-shil (Announcer at KBS)
정용실 (KBS 아나운서)
매일 사람들 붐비는 거리를 통과해 출근하고, 줄을 서서 모닝커피를 마시고, 회사를 들어가서는 매일매일 바뀌는 출연자들과 방송을 하고, 방송이 끝나면 또 동료들과 어울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저녁이면 강의를 듣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바쁘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SNS에 올려야 하루가 마무리된다. 하루 스케줄이 숨 쉴 틈 없어야 마치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끊을 斷(단)’이라는 글자를 선물로 주었다. 이젠 끊을 걸 끊고 좀 조용히 살란다. 난 그 선물을 들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마치 이 세상을 이렇게 바쁘게 살아온 내 모습이, 쳇바퀴를 너무나 열심히 돌리는 다람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것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듯이 그냥 그 쳇바퀴 위에서 내려오면 될 것을 내려오지 못하고 남들이 돌리고 있으니 불안하여 아무 생각 없이 끝없이 돌리고 있는 모습. 그런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곰곰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는 와중에 코로나 19사태가 터졌다.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집에서 알 수 있고, 시간이 날 때면 전 세계를 여행하고, 많은 곳에서 친구를 만들고, 새로운 일을 도모했다. 지구상엔 우리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방해하는 존재는 없었다. 이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우리의 배경인 것만 같이 여겨졌다. 天上天下(천상천하) 唯我獨尊(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실감되었다. 마치 ‘끊을 斷(단)’이라는 말조차 잊고 살았던 내 모습처럼 말이다.
어느 학자는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다. 인간이 ‘교만’과 ‘겸손’을 반복하는 역사가 이어져왔다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시기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시기가 번갈아 왔다는 말이다.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 이전이 ‘교만’의 시기였다면, 코로나 이후는 ‘겸손’의 시기가 아니겠는가.
코로나19가 시작되고서는 막연한 두려움에 집 안에 처 박혀서 곧 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그 전으로 돌아가 사람들을 만나고, 수다 떨고 하리라 기대했지만... ...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젠 그런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 그 기대에 찬 날들이 1,2년 뒤에라도 오기만을 바랄 뿐. 집과 회사, 공원, 집, 회사, 공원, 집, 회사, 공원... ... 답답한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대신 이 긴 침묵의 시간, 긴 절제의 시간, 길고 긴 텅 비움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최근에 와서야 들었다. 그 시끄럽고, 화려하고, 번잡함에 가려진 소중한 것들이 눈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마스크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며 길을 걷다가 그 땀을 식혀주는 선선한 한 줄기 바람, 집 안에서 하염없이 나 만을 기다리는 말없는 나의 반려견, 집 한 견 화분에서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한 그루 고무나무, 집 주변을 감싸고 묵묵히 서있었던 벚꽃나무, 구수하게 다가오는 커피 내리는 냄새, 책장을 가득 채운 내가 좋아하는 온갖 책들, 그리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주고 있는 가족들... ....
내 삶을 감싸고 있는 작은 하나하나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보게 되고, 그들이 내 삶을 어떻게 지탱해주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만든다.
삶이 달라져야 할 때인 것 같다. 삶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하겠다.

얼마 전부터 책 정리를 하고 있다.
내가 삶을 바꾸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책장을 정리하는 것. 마치 내 머리 속을 정리하듯 책장의 배열과 버릴 책을 뽑아내는 일이다. 그리고 맘이 끌리는 대로 책을 하나씩 꽂아본다.
자연스레 책을 꽂으니 나의 내면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먼저 ‘자연’에 대한 책들을 읽어야겠다.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고 말만 하고 인간의 뿌리인 자연으로서의 내 모습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인간의 오만으로 세상을 바꾸기 전 우리네 모습은 어땠을까. 어떻게 자연과 어울리며 살았을까. 나는 강가를 걸을 때 내 몸을 감싸는 바람을 느끼며 가끔 저 먼먼 시간 속으로 젖어 들기도 한다. 바람 부는 언덕 위에서 바람 소리를 듣고 있는 한 석기시대 여성이 된다.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나는 순해지고 선해지고 있다. 그리고 가끔은 자연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겸손함을 배우게 된다. 이런 자연의 일부인 내 자신의 본성을 회복해보고 싶다. 자연으로서 인간의 삶도 고민해보고 싶다. 왠지 모르게 그 안에 치유의 가능성이 있을 것만 같아서다.
그리고 또 하나 ‘SF소설’을 읽어보려 한다. 미래를 설명하는 수많은 인문학과 미래학 서적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과거를 분석해 다가오지 않은 시대를 예측하고 있다. 과거는 과거이고 사실 미래는 미래다.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또, 예측은 말하여지는 순간 달라질 가능성이 커진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리어 난 소설을 읽어야겠다. 우리는 늘 소설을 한낱 상상 속 이야기 거리로 치부해버리지만, 한 작가의 상상력은 그냥 나오지 않는다. 그 시대의 응집된 욕망과 에너지들이 작가를 통해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들의 예민한 안테나만이 남들이 느끼지 못한, 보지 못하는 걸 잡아내기 때문이다. 감춰진 퍼즐의 한 조각을 찾듯 소설 속에서 미래의 고통을 풀어갈 열쇠가 있는지 알고 싶다. 왠지 그 안에 해답이 있을 것만 같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전과 다르게 살게 될 것이다.
긴 침묵의 시간 이후 대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듯, 긴 고립의 시간 후 우리 인간이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간만이 아닌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될 것 같다. 이런 긴 자성의 시간을 맞이한 우리는 이 시간을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 이 시간을 제대로 보내야 조금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